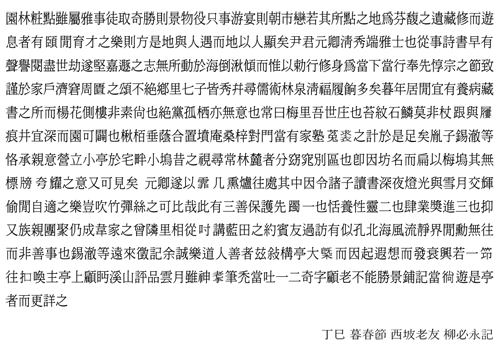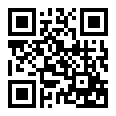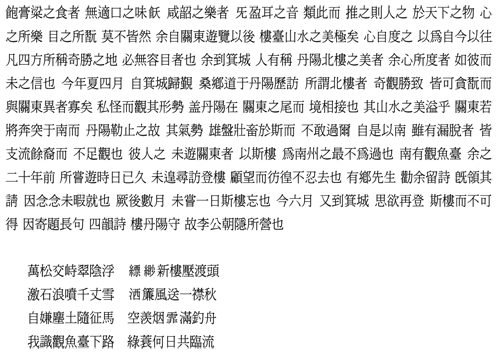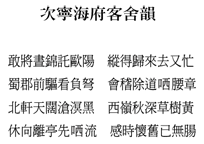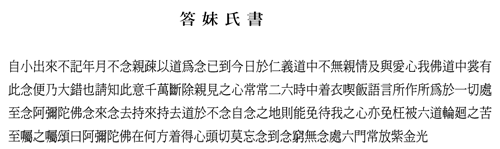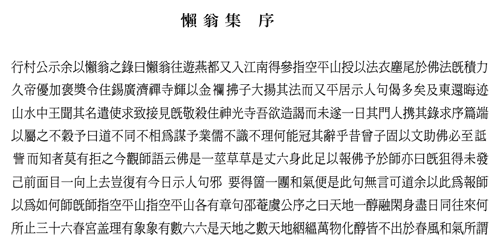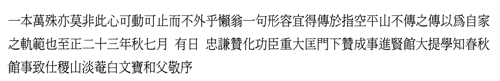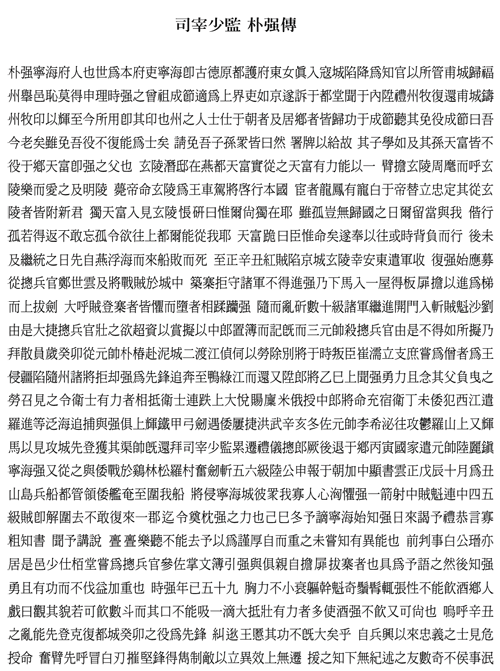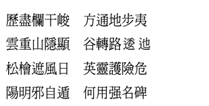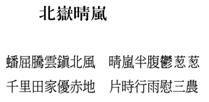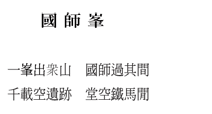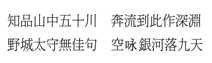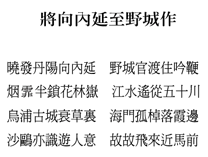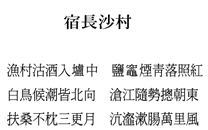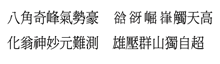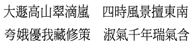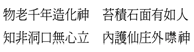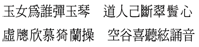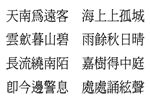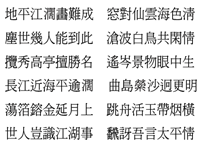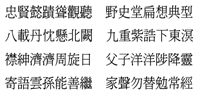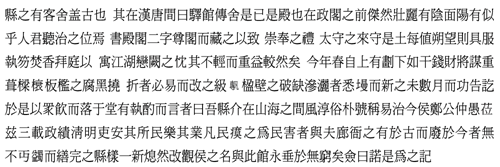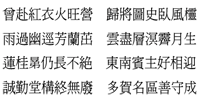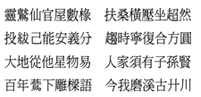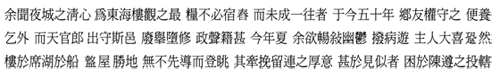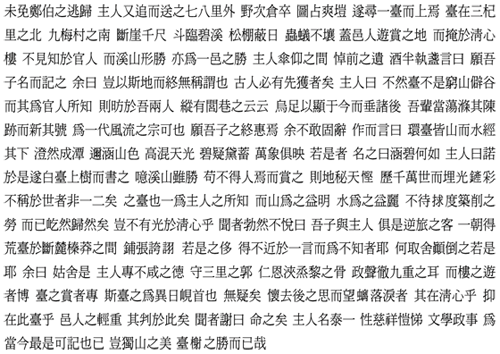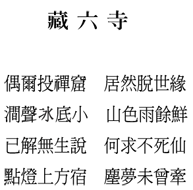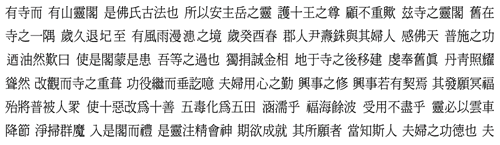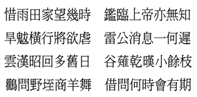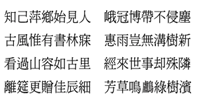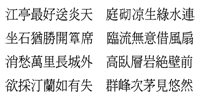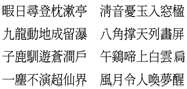제2절 고시문(古詩文)의 향기
여기에서의 고시문이란 대개 한자를 빌려 개인의 정서와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문학형식을 말한다. 또한 고시문은 그 나타내고 있는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그 역사도 길며, 달리 한문학이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덕의 고시문도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시문을 「동문선(東文選)」을 통하여 살펴보면 사(辭)·부(賦)·고시(古詩)·율시(律詩)·절구(絶句)·배율(排律)·조칙(詔勅)·교서(敎書)·제고(制誥)·책문(冊文)·비답(批答)·표전문(表箋文)·계(啓)·장(狀)·노포(露布)·격문(檄文)·잠(箴)·명(銘)·송(頌)·찬(贊)·주의(奏議)·차자(箚子)·잡문(雜文)·서독(書牘)·기(記)·서(序)·설(說)·논(論)·전(傳)·발문(跋文)·치어(致語)·변(辨)·대(對)·지(志)·원(原)·첩(牒)·의(議)·잡저(雜著)·책제(策題)·상량문(上樑文)·제문(祭文)·축문(祝文)·소문(疏文)·도량문(道場文)·재사(齋詞)·청사(靑詞)·애사(哀詞)·뇌문(文)·행장(行狀)·비명(碑銘)·묘지(墓誌) 등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한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시문도 대개 위와 같은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역사도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고시대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문학활동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시문의 제목이나 시문이 남겨진 것은 대개 고려말 이후부터이다.
고려 때에는 김택(金澤)의 “무가정원운(無價亭原韻)”, 안축(安軸)의 “기제단양북루시(寄題丹陽北樓詩)”, 가정 이곡의 “무가정차운”, “영해부신작소학기”, 담암 백문보(淡庵 白文寶), 박효수(朴孝修), 박치안(朴致安)의 시구와 목은 이색의 관어대소부, 유사정기(流沙亭記) 외에 여러 편의 시,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의 시들이 있으며, 특히 불교문학의 백미(白眉)라고 하는 나옹선사의 게송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하여 고려말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문흥(文興)를 알 수 있다 하겠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저 권근, 변계랑, 안로생, 홍여방 등의 외지의 시인 묵객들과 우리 군 태생의 많은 문인들의 시문들이 조선 5백년 동안 각종 문집류 등에 등재되어 지역의 문풍을 날렸으며,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문사들이 주옥같은 시문을 남겨 지역문화를 한차원 높여 승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고려와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의 문적(文籍)과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 중에 지역의 지명을 통하여 지역의 정서를 드러낸 시문을 간택하여 지역 한문학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고려시대의 고시문은 특별한 구분없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며,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고시문은 산수(山水), 루정, 사찰, 그리고 기타 부(賦)와 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짧은 기일과 부족한 재주로 이 분들의 문의(文意)를 다 드러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면 관계상 모든 분들의 시문을 싣지 못함을 한(恨)하고자 하며, 다음 기회에 반드시 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자 한다.
1. 고려시대의 고시문
가정 이곡의 「영해부신작소학기」에 의하면 영해에도 상당한 유생(儒生)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남겨놓은 문적(文籍)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겨우 우거한 가정 이곡과 창수면 가산리 태생의 나옹선사, 영해면 괴시리 출생의 목은 이색 등의 시부와 이 지역을 스쳐간 이들의 시문을 통하여 당시의 편린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1) 근재(謹齋) 안축(安軸)의 단양 북루에 제(題)하여 부치는 시(寄題 丹陽北樓詩) 병서(幷書)
근재 안축(1287∼1348)은 고려말의 문신이며, 본관은 순흥으로 경기체가인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을 지어 문명이 높았다. 위의 시는 그가 1330년 강원도 존무사로 임명받아 관동팔경을 유람할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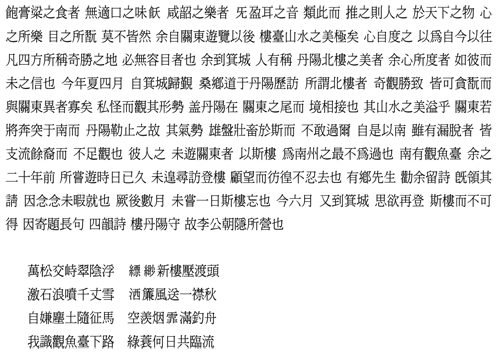 |
| |
|
기름진 음식을 포식한 후에는 아무리 먹어도 맛있는 음식은 없으며, 소(韶)와 같은 음악을 모두 들은 후에는 더 이상 귀에 가득 채울 소리는 없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보아 천하의 물류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즐기는 바와, 눈으로 감상하는 바가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관동으로부터 유람이후 루대와 산수가 지극히 아름다웠지만, 스스로 마음을 헤아려 이제나 지난 것이나 무릇 사방에 기이한 명승지라 칭송되는 곳도 반드시 눈에 찼다고 할 수는 없다하겠다.
내가 기성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단양(영해)의 북루가 아름답다고 칭송을 하였다. 나는 마음을 헤아려본 바 이것도 그것과 같을 것으로 생각하여 믿지는 않았다. 금년 여름 4월에 기성으로부터 동해고을로 돌아가는 길에 단양을 방문하여 소위 북루를 보았는데, 기이한 관경과 명승은 가히 보기에 탐낼 만한 것으로 관동과 더불어도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 지형과 지세를 보면 괴이한데, 단양이란 관동의 꼬리로 경계를 서로 접하고 있으며, 그 산수는 넘칠 정도로 아름답다. 관동이 남으로 달려 돌출하여 단양에 머물러 그치는 고로 그 기세가 이곳에서 웅장, 장대하게 뭉쳐있다고 해도 감히 지나치지 않다.
이곳으로부터 남으로도 비록 흘러 빠진 것이 있지만 만족히 볼만한 것은 없다. 그 사람들이 관동을 유람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루가 남쪽 땅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남쪽에는 관어대가 있는데, 나는 일찍이 20년 전부터 유람한지 오래지만 이 누는 한가로이 찾아 오르지 못하였으며, 가보고자 하였지만 미적거리며 배회하다 참아 가지를 못하였다. 향내의 선비 중에 나에게 시를 남길 것을 권하기에, 이미 그 청을 받아들였지만, 생각과 생각을 해봐도 여가를 갖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하루도 이 루를 잊어본 적은 없다. 금년 6월에 또 다시 기성에 도착하여 재차 이 루에 오를 생각을 하였으나, 역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제목을 정하고 장구의 4운의 시를 지어 부친다. 이 루는 단양의 태수 고 이공 조은이 세운 것이다.
|
| |
얽혀 우뚝 솟은 만송(萬松), 푸른 그림자 띄우고
새로이 선 루, 아득히 나루터를 누르네
바위에 부딪치는 물결 천길 눈같이 희게 부서지고
주렴을 쓸어가는 맑은 바람은 가슴속 한 가을일세
세상 싫어 여행 길 따랐지만
안개 비 속의 가득 찬 낚시배 타길 바라는 건 공허한 것
내, 관어대 내려가는 길 알지만
낚시꾼들과 같이 흘러갈 날 언제일까?
|
| |
2) 가정 이곡(稼亭 李穀)의 시
가정 이곡(1298∼1351)은 고려말의 학자이며, 정치가로 1317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며, 당시 영해향교 대현이던 김택의 여식과 결혼하여 영해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원나라의 과거에도 급제하여 문명을 날렸으며, 귀국하여 대소의 관직을 거친 후 정당문학도첨의찬성사 한산군으로 봉해졌으며, 가정집 4책 20권이 전하며, 영해 관련 많은 시문들이 있다. 시효는 문효(文孝)이다.
다음은 영해부의 객사의 원운에 대하여 차운한 시이다. |
| |
|
|
| |
감히 주금당기를 구양수에게 부탁하듯 하면
설령 얻겠지만 또 다시 바쁘게 가야할 것이네
촉군의 한 현령이 노시(弩矢)를 짊어지고 앞장서 듯 하였지만
허리띠에 문장(紋章)차고 회계에서 길 닦음같이 웃음거리네
헌함의 북쪽에서 보는 하늘은 드넓고, 바다는 검은데
가을 깊은 서쪽 재에는 초목조차 누렇게 익어 가느니
이별하는 정자에서 눈물부터 먼저 뿌리지 말게나
때를 느끼고, 옛일을 회상하는 것은 이미 내 뱃속엔 있지 않으이
|
|
|
3) 나옹화상의 서한(書翰)
나옹화상(1320∼1376)은 창수면 가산리 태생의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인물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구법수행을 위하여 산천을 주유하였으며, 득도 후에는 1347년에 원나라로 구법 유학을 하여 고려의 선지식을 널리 알렸으며, 1358년에는 귀국하여 공민왕의 왕사로 봉해진 고려말의 대선승으로 「나옹화상어록」 1권과 「가송(歌頌)」 1권의 저작을 남겼다. |
| |
|
|
| |
|
매씨(妹氏)에게 답함
나는 어려서 집을 나와 햇수도 달수도 기억하지 않고 친한 이도 먼 이도 생각하지 않으며, 오늘까지 도(道)만을 생각해 왔다. 인의(仁義)의 도에는 친하는 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지마는, 우리 불도에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 큰 잘못이다. 이런 뜻을 알아 부디 친히 만나겠다는 마음을 아주 끊어버려라.
그리하여 하루 스물 네 시간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문답하는 등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하여라. 끊이지 않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억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는 경지에 이르면, 나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헛되이 6도(六道)에서 헤매는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부탁하며, 게송으로 말하겠다.
|
|
|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마음이 다하여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섯 문(六門)에서 언제나 자금광을 뿜으리.
|
| |
4)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시와 관어대부(觀魚臺賦)
목은 이색(1328∼1396)은 고려말의 정치가이며, 대학자, 그리고 충신으로 가정 이곡의 아들이다. 1328년 영해면 괴시리에서 출생하였다. 134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1353년에는 원나라에서도 과거에 급제하여 문명을 날렸다.
이후 고국에 돌아와서 대사성, 예문관대제학, 성균관대사성, 한산부원군으로 봉해졌다. 유학의 중시조로 추앙을 받고 있으며, 「목은유고」, 「목은시고」가 있다.
(1) 憶寧海
東海西涯一點山 太平煙火畵圖間
欲敎長句全篇好 未辦浮生半日閑
夢裡銀河連赤岸 病中華髮照蒼顔
恭桑敬梓眞無賴 空望遙天鳥自還
동해의 서쪽 해안에 한점의 산이 있으니
태평스레 밥 짓는 연기 속에 그림 같으이
좋은 칠언율시와 시문을 가르치고자 하였지만
떠도는 인생 반나절의 한가함도 나누어지지 않네
꿈속의 은하수는 붉은 해안에 이어져 있고
백발은 늙어 병들은 창백한 얼굴에 비추네
그 좋은 고향 생각에 수심이 게워
새조차 스스로 돌아오는 아득히 먼 하늘 바라본다네.
|
| |
|
(2) 觀魚臺賦
|
| |
觀魚臺賦序 : 觀魚臺在寧海府臨東海石岩下游魚可數故以名之府吾外家也爲作 小賦庶幾傳之中原耳.
觀 魚 臺 賦 : 丹陽東岸日本西洪濤莫知其他.其動也如山之頹其靜也如鏡之磨風伯之所海若之所室家長鯨群戱而勢搖大空鳥孤飛而影接落霞有臺 俯焉目中無地上有一天下有一水茫茫其間千里萬里惟臺之下波伏不起俯見群魚有同有異洋洋各得其志任公之餌誇矣.非吾之所敢冀太公之釣直矣.非吾之所敢擬嗟 夫我人萬物之靈忘吾形以樂其樂樂其樂以沒吾寧物我一心古今一理孰口腹之營營而甘君子之所棄慨文王之旣沒想於而難企使夫子而乘亦必有樂乎.此惟魚躍之斷章乃中庸之大指庶沈潛以終身幸衣於子思子
|
| |
관어대부의 서문 : 관어대(觀魚臺)는 영해부(寧海府)에 있으며, 동해에 접해 있다. 바위 아래에 노는 물고기를 셀 수 있는 곳이므로 관어대라고 이름한 것이다. 영해부는 나의 외가(外家)이며, 소부(小賦)를 짓는 것은 혹시 중원(中原)에 전(傳)하기 위해서이다.
관어대 부(賦) : 영해(丹陽)의 동쪽, 일본(日本)의 서쪽 사이에는 큰 물결이 아득히 펼쳐져 있는 곳으로 그 밖의 것은 알수 없는 곳이다. 그 큰 물결이 움직이면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물결이 고요할 때에는 거울을 닦아 놓은 듯 하느니.
풍백(風伯 : 바람을 말은 신)이 풀무로 쓰는 곳이요, 해약(海若 : 바다의 신)이 제 집으로 삼는 곳, 고래들이 길게 떼를 지어 희롱하는 그 기세는 창공(蒼空)을 흔들고, 외로이 나는 사나운 새 그림자가 떨어지는 노을에 이어지는 곳, 그곳에 대(臺)가 있구나.
굽어보느니 땅위에도 하나, 하늘 아래에도 하나, 오직 물뿐, 그 사이는 아득히 천리, 만리지만 오직 대(臺) 아래만 파도가 자는 듯 일지 않으니 굽어보니 같은 놈, 서로 다른 놈, 어릿어릿하는 놈, 천천히 꼬리를 치는 놈, 온 갓 고기들이 제각기 제뜻대로 노니누나.
임공(任公)이 백마(白馬)를 미끼로 용을 낚았다는 과장(誇張)을 내가 감히 바라는 바가 아니며, 강태공(姜太公) 곧은 낚시도 내가 감히 흉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진데, 아,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나의 형체(形體)를 잊으며, 그 즐거움을 즐기며, 그 즐거움을 즐겨서 나의 편안함에 몰각(沒却)하나니, 물(物)과 내가 한 마음인 것은 고금(古今)이 같은 이치이니라.
누가 구복(口腹)을 위하여 급급히 굴어, 군자(君子)이 버리는 바에 감심(甘心)하리요. 문왕(文王)은 이미 가고 없으니 오인어약(於魚躍)을 생각하여도 기도(企圖)하기 어려우니 개탄스러우며, 공부자(孔夫子)로 하여금 뗏목을 타게 하여 우리나라에 온다해도 이 역시 즐거워함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건데 「물고기가 못에서 뛴다」고 한 글귀는 곧 중용(中庸)의 큰 뜻이다. 그 뜻에 잠기어 탐구하면서 일생을 마친다면 다행이 자사(子思 )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리라.
5) 담암 백문보(淡菴 白文寶)의 나옹집 서(懶翁集 序)
담암 백문보(1303∼1374)는 충숙왕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밀직제학, 정당문학을 역임하였으며, 직산군으로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학문으로 이름이 높아 많은 시문을 남겼다. 특히 창수면 가산리 출생의 나옹선사의 문집인 「나옹집」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다음은 나옹집의 서문이다.
|
| |
|
|
서(序)
행촌공(杏村 : 李. 고려말의 문신, 문하시중)이 나옹스님에 관한 기록을 내게 보이면서, 나옹스님은 연도(燕都)에 가서 유학하고 또 강남(江南)으로 들어가 지공(指空)스님과 평산(平山)스님을 찾아 뵙고 공부하고는 법의(法衣)와 불자(拂子)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법에 힘써 왔다고 하였다.
원제(元帝)는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며 광제선사(廣濟禪寺)에 머물게 하고, 금란가사(金袈裟)와 불자를 내려 그의 법을 크게 드날렸으며, 또 평소에도 스님의 게송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 주었다고 한다.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산수(山水) 속에 자취를 감추었는데, 왕이 스님의 이름을 듣고 사자를 보내 와주십사하여 만나보고는 공경하여 신광사(神光寺)에 머무시게 하였다. 나는 가서 뵈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하루는 스님의 문도가 스님의 어록을 가지고 와서 내게 서문을 청하였다.
그때 나는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는 법이오. 나는 유학(儒學)하는 사람이라 불교를 모르는데 어찌 서문을 쓰겠소”라고 하였다. 또한 옛날 증자고(曾子固)는 “글로써 불교를 도우면 반드시 비방이 따른다”고 하였지만 아는 사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지금 스님의 어록을 보니 거기에 “부처란 한 줄기 풀이니, 풀이 바로 장육신(丈六身 : 佛身)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면 부처님 은혜를 갚기에 족하다.
나도 스님에 대해 말한다.
나기 전의 면목을 이미 보았다면 한결같이 향상(向上)해 갈 것이지 무엇 하려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글을 보이는가. 기어코 한 덩이 화기(和氣)를 얻고자 하는가.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나도 이로써 은혜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님은 지난날 지공스님과 평산스님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지공스님과 평산스님도 각각 글을 써서 법을 보였다.
소암 우공(邵庵虞公)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
| |
천지가 하나로 순수히 융합하니
한가한 몸이 온종일 한결같다
왔다갔다하다가 어디서 머물까
서른 여섯의 봄 궁전이다
|
| |
대개 이치에는 상(象)이 있고 상에는 수(數)가 있는데, 36은 바로 천지의 수다. 천지가 함하고 만물이 자라는 것이 다 봄바람의 화기에 있듯이, 이른바 하나의 근본이 만 가지로 달라진다는 것도 다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옹스님의 한마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부디 지공스님이나 평산스님의 전하지 않은 이치를 전해 받아 자기의 법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정(至正) 23년(1363) 가을 7월 어느날,
충겸찬화공신 중대광문하찬성사 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치사 진산담암 백문보 화보는 삼가 서한다.
6)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의 시
운곡 원천석(1330∼?)은 고려말과 조선초에 생존한 은사(隱士)로 고려가 망하자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다음의 시는 그가 전국을 유람하며, 영덕과 영해에 들를 때 지은 시중(詩中)의 1수이다.
|
| |
着 盈 德
雲淡風輕十里程 馬頭山好雨新晴
小溪淸淺城東路 一樹海花隔水明
옅은 구름, 가벼운 바람 십리 여정에
말머리 앞의 산, 비 개이니 더욱 청명하고
맑고 얕게 흐르는 개울물 성 동쪽 길 따라 흐르는데
한 그루 해당화만 맑은 물위에 밝게 비치네
|
| |
|
7) 양촌 권근(陽村 權近)의 전류(傳類)
|
양촌 권근(1352∼1409)은 고려말과 조선초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다. 고려말에 명나라에서 온 국서를 미리 뜯어 본 죄로 1389년에 영해와 흥해로 귀양을 왔다. 유배를 와서 영덕현의 객사기와 영해부의 서루기를 지었으며, 다음의 박강전(朴强傳)도 이때 지었다.
|
| |
|
|
|
|
사재소감(司宰少監) 박강(朴强) 전(傳)
박강은 영해부(寧海府) 사람인데, 대대로 본부(本府)의 아전 노릇을 해왔다. 영해는 곧 옛적의 덕원도호부(德原都護府)인데, 동여진(東女眞)이 침략할 때 성이 함락되었으므로 낮추어 지관(知官)으로 만들고 관할하던 보성(甫城)은 복주(福州 : 안동)에 귀속시켰다.
온 고을의 사람들은 이를 수치로 여기면서도 도로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때 박강의 증조인 성절(成節)이 마침 상계리(上計吏)가 되어 서울에 가 드디어 도당(都堂)에 진정하였더니, 임금이 듣고서는 다시 예주목(禮州牧)으로 올리고 보성을 도로 복귀시킨 다음, 주목(州牧)의 인(印)을 주조하여 내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곧 그 인이다. 그 고을의 인사로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절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는, 면역(免役 신역을 면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니, 성절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면역된다 하더라도 다시 양반은 되지 못할 것이니, 내 자손이나 면역시켜달라.”고 하므로, 여러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라” 하고는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학여(學如) 및 그의 손자 천부(天富)가 모두 향역(鄕役)을 하지 않았으니, 천부는 곧 강의 아버지이다.
현릉(玄陵 : 공민왕) 이 즉위하기 전에 연도(燕都)에 있을 적에 천부가 모시고 있었는데, 힘이 세어서 한쪽 팔로 현릉을 번쩍 들고서 한 바퀴 돌며 고함을 치곤 했으므로, 현릉이 즐거워하며 그를 아꼈다.
명릉(明陵 : 충목왕)이 훙(薨)하자 황제(원의 순제)가 현릉을 임금으로 세워라 명하였다. 현릉의 행차가 장차 본국으로 떠나려 하는데,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환자(宦者) 용봉(龍鳳)이 황제에게 아뢰어 충정왕(忠定王)으로 갈아세우게 하였다. 그러자 그때까지 현릉을 따르던 자들이 모두 새 임금에게로 따라붙었으나, 천부만이 들어와 현릉을 뵈니, 현릉이 비통한 어조로 이르기를, “너만이 아직 있었구나. 나라고 어찌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없겠느냐! 너는 머물러 있다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돌아가게 되면 너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상도(上都)로 가려 하는데 나를 따라 가겠느냐?”하니, 천부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신은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하고, 드디어 모시고 갔는데 때로는 등에 업고 가기까지 하였다.
그 뒤 현릉이 미처 임금자리에 오르기 전에 연도(燕都)에서 바다를 건너 돌아오다가 배가 파선되어 천부는 죽었다.
지정(至正) 신축년(공민왕 10년, 1361)에 홍건적(紅巾賊)이 경성(京城)을 함락하자 현릉이 안동(安東 )으로 파천하여, 군대를 보내 수복할 때에 강(强)이 처음으로 군에 응모하여 총병관(摠兵官) 정세운(鄭世雲)장군 진영에 배속되었다. 접전이 시작될 무렵에 적이 성중에서 목채(木寨)를 설치하여 항전하므로 제군(諸軍)이 전진할 수 없게 되매, 강은 곧 말에서 내려 어떤 집에 들어가 판자로 된 대문짝을 떼어 가지고 나아가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며, 크게 고함을 치니, 목책 위에 올라 있던 적들이 모두 질려서 땅에 떨어져 저희끼리 서로 짓밟았다. 강은 따라 내려와서 수십 명을 마구 베었다. 이로써 제군이 계속 전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적의 괴수 사류(沙劉)를 베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첩(大捷)을 거두었으므로, 총병관은 이를 장렬히 여기어 상으로 자급(資級)을 특진시켜 중랑장(中郞將)에 의주(擬注)하여 문부(文簿)에 기록하였는데, 좀 뒤에 삼원수(三元帥)가 총병관을 죽였기 때문에 의주(擬注)했던대로 되지 못하고 마침내 산원(散員)에 제수되었다.
계묘년(공민왕 12, 1363)에 원수 박춘(朴椿)을 따라 이성(泥城)에 가서 두 번이나 강을 건너가 탐정하였는데 이 공로로 별장(別將)에 제수되었다. 이때에 반신(叛臣) 최유(崔濡)가, 왕실의 서자로서 일찍이 중이 되었던 자를 임금으로 세우고 변경을 침입하여 수주(隨州)를 함락하므로 여러 장수가 항전하여 물리쳤는데, 강이 선봉이 되어 압록강(鴨綠江)까지 추격하였다가 돌아와서 또 낭장(郎將)에 승진되었다.
을사년(공민왕 14, 1365)에 상이 강이 용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그의 아비가 자기를 업고 다니던 공로를 생각하여 그를 불러 보고는, 힘이 센 시위군(侍衛軍)과 씨름을 시켰더니 시위군이 잇달아 넘어지매, 상은 크게 기뻐하여 늠미(米)를 내리고 바로 중랑장(中郞將)에 제수하여 숙위(宿衛)에 소속시켰다.
정미년(공민왕 16, 1367)에 왜적이 강서(江西)를 침범하므로 나진(羅進) 등을 보내어 바다에 나아가 추격할 때에 강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상이 철갑(鐵甲)과 활과 칼을 하사하였으며, 왜적을 만나 여러 번 이겼다. 홍무(洪武) 신해년(공민왕 20, 1371) 겨울에 원수(元帥) 이희필(李希泌)을 도와 울라산(鬱羅山)을 공격할 때에도, 상이 또 말을 주어 보냈는데, 성을 공격할 때 먼저 올라가서 그 괴수를 잡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사재소감(司宰少監)에 제수되었고, 여러 번 승진하여 예의총랑(禮儀摠郞)에 이르렀다.
그 뒤에 시골에 은퇴하여 있다가 병인년(우왕 12, 1386)에 나라에서 원수 육여(陸麗)를 보내어 영해(寧海)를 진수하게 할 때에도 강이 또 종행하였는데, 계림(鷄林) 송라촌(松羅村)에서 왜적과 싸울 때에 칼을 휘둘러 5∼6명을 베니, 육공(陸公)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여 중현대부(中顯大夫)에 가자(加資)되고 서운정(書雲正)으로 제수 되었다.
무진년(우왕 14, 1388) 10월에 축산도 병선도관령(丑山島 兵船都管領)이 되었는데, 왜적의 배가 갑자기 들이닥쳐 우리의 배를 포위하고 영해성(寧海城)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인심이 흉흉하였다. 강이 한 번 활을 쏘아 적이 괴수를 맞히고 잇달아 4∼5명을 쏘아 맞히니, 적은 포위를 풀고 달아나 다시 오지 않았다. 온 고을이 지금까지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강의 힘이었다.
을사년(공양왕 1, 1389) 겨울에 내가 영해에 귀양갔다가 비로소 강을 알았는데, 날마다 찾아와 뵙되 예절바르고 말이 적으며, 글을 대강 알아 나의 강설(講說)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갈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나는 그를 근후(謹厚)한 사람으로 중히 여겼을 뿐 그에게 특이한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전에 판사(判事)를 지낸 백공 진(白公 瑨)이 또한 이 고을에 살았는데, 젊어서 백당(栢堂 사헌부의 별칭)에 벼슬하여 일찍이 총병관(摠兵官)의 참좌(參佐)가 되어 문서를 맡아보면서 강과 함께 다녔는데 직접 판자 대문짝을 메고 목책을 점령하는 것을 본 분이라, 나에게 상세히 이 이야기를 해 주었으므로 비로소 박강이 용맹이 있고 또한 공로가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중히 여겼다. 이때 박 강의 나이가 이미 59세였는데 힘이 조금도 줄지 않았으며, 몸집이 기걸하며 수염이 길게 느려졌는데, 천성이 술을 마시지 못하였다. 고장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기를, “외모를 보아서는 두어 말이라도 마실 수 있을 듯한데,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다.”하였다. 대저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은 술주정이 많은 법인데, 강은 술을 마시지 못하니 가상한 일이다.
아! 신축년 난리에는 능히 먼저 올라가서 도성(都城)을 수복하였고, 계묘년 싸움에는 선봉이 되어 반역을 무찔렀으니, 그 공적이 얼마나 컸는가!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충의를 가진 용사가 위급함을 당하여 목숨을 바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소리치며 칼날을 무릅쓰고 강한 적의 선봉을 꺽고, 막아내어 특출한 공로를 세웠으나, 위에서 추천하여 발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래로는 그것을 기술해 주는 친구도 없어, 덧없이 흐르는 세월에 사적이 없어지고 전하지도 못한 채 마침내 시골에서 죽어 버려 초목과 함께 썩고 마는 사람이 얼마이랴! 이것은 가엾은 일이다. 그러므로 박 강에 대하여 전기를 쓴다.
|
|
|
| |
| |
|